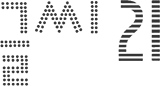|
[특집] 도심 속의 아름다운 글씨 탐방1 - 성균관을 찾아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데이트나 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맛집탐방 코스가 선풍적이다.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이제는 어디에 가서든 시장한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으려 하지 않는다. 기왕이면 소문난 집에서 맛을 즐기길 원한다. 이에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맛집’을 찾는다. 유명 맛집은 무더위에도 1시간씩 대기하며 문전성시를 이룬다. 맛집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맛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음식의 향과 비쥬얼, 맛은 물론이고 그 집에 대한 내력과 소소한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먹거리 만큼이나 우리의 볼거리는 없을까 하고 글씨21에서 찾아 나섰다. 마침 ‘맛집 탐방’ 만큼이나 흥미롭게 ‘글씨 탐방’을 풀어낸 대학의 강의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대학교의 한 수업에서 아주 재미난 과제가 공지되었다. 경기대학교 예술체육대학 한국화·서예학과 전공수업인 장지훈 교수의 ‘서예학개론’이다. <도심 속의 아름다운 글씨를 찾아서>라는 주제의 과제는 학생들이 도심 곳곳에 퍼져있는 아름다운 글씨를 직접 찾으러 떠난다. 책,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자료를 미리 조사하고 글씨가 있는 곳을 현장 탐방한다. 그 곳에서 글씨를 직접 감상하고 평가하고 분석하여 자기만의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낸다. 장지훈 교수는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보고 착안했다. 서예학개론이 원래 딱딱한 이론수업이라 텍스트로 가르친들 학생들이 수업 때만 잠시 익힐 뿐 크게 활용되지 않더라. 이론으로 배운 글씨의 세계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수업에 아름다운 글씨탐방을 주문했다.”며 수업을 통해 서예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품격있는 글씨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글씨21은 이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직접 방문하고 조사한 보고서를 특집기사로 다룬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에는 어떤 글씨가 있을까 - 성균관의 아름다운 현판을 찾아서 - 경기대 서예학과 2학년 송유나 · 이다혜 벚꽃이 만개해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예쁜 사진을 찍으려 서울 도심을 누비다 보면, 심심치 않게 꽃들과 어우러진 고궁(古宮)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고궁의 모습을 보고 이름이 무엇인지,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현판’이다. 옛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판은 그 건축물의 시간과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건축물이 어떤 기관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현판에 쓰인 글씨는 해당 건축물이 지어진 시대에 살고 있던 최고의 학자, 명필가, 혹은 임금님이 하사한 글씨로 제작된 것이어서 역사적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고궁 중에서도 조선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찾아가 현판의 글씨를 감상해 보았다. 성균관의 현판은 전(殿)마다 모두 쓴 이가 달랐으며 현판 문구의 의미, 서체의 선정, 현판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선현들의 고심이 담겨있었다. 성균관에는 수많은 현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교사회인 조선의 최고 교육 기관이 성균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의미가 깊은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의 현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처음으로 소개할 현판은 ‘대성전(大成殿)’이다.

<그림1>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의 현판
성균관에서 대성전은 공자를 모시는 사당의 역할을 하는데, 공자를 비롯하여 선현(先賢) 39명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대성전의 ‘대성(大成)’은 공자의 시호(諡號)인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을 두 글자로 축약한 것인데, 처음부터 시호가 이렇게 길었던 것은 아니었다. 739년 당나라 현종 때에 ‘문선왕(文宣王)’이라는 시호를 시작으로, 송나라 진종 때에는 ‘지성문선왕(至聖文宣王)’이었고, 원나라 무종 때에 이르러서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시호를 갖추게 되었다. ‘대성전’의 글씨는 당대 최고의 명필가로 통하였던 석봉(石峯) 한호(韓濩, 1543~1605)의 글씨로 전해지며, 서체는 해서(楷書)체로 쓰여졌다. 서체가 단정하고 획이 굵은 편이어서 골법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비평을 받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으로는 공적 기관인 성균관에 걸리는 글씨인 만큼 정갈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현판은 ‘명륜당(明倫堂)’이다.

<그림2> 성균관 명륜당(明倫堂)의 현판 1
명륜당은 대성전 문묘 뒤에 지어져 조선의 유생들이 문과(文科)를 준비하며 유교경전을 강학하던 장소이다. ‘명륜(明倫)’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보면 윤리, 그 중에서도 인륜을 밝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와 명분을 중요시했던 유학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익히게 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명륜당의 글씨는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朱之蕃, 1565~?)이 썼으며, 대성전의 현판과 마찬가지로 해서체로 쓰여졌다. 주지번이 조선에 사신으로 와 있으면서 써준 현판 중 해서로 된 현판은 4점이 있는데, 그 중 명륜당의 서체는 다른 현판의 서체에 비해 획의 굵기가 얇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 어질게, 하지만 강직한 심성의 수련을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과 부드럽지만 무르지 않은 굳셈이 느껴지는 현판 서체가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3> 성균관 명륜당(明倫堂)의 현판 2
이 현판 역시 명륜당의 현판이며, 명륜당 안쪽에 걸려있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주자(朱子)’로 알려져 있는 주희(朱熹)의 글씨이다. 이 글씨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으나, 오랜 설전과 연구 끝에 주희의 글씨로 밝혀졌다. 위에서 언급한 주지번이 쓴 명륜당의 현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즉, 해서체라는 점, 느낌이 점잖고 단정하다는 점은 비슷하나, 이 글씨는 주지번의 글씨와 비교했을 때 육(肉)이 좀더 많으며 기필, 수필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감춰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닌, 나무의 색 그대로에 바래져 있는 금빛의 글씨를 보고 있자면 주지번이 쓴 현판보다 건물과 더욱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림4> 성균관 명륜당 경내의 은행나무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명륜당 앞 돌계단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눈 앞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다. 제법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알아본 결과,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균관을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였다. 천연기념물 제 59호로 지정되었으며 실제로 보면 나무라는 생명체가 주는 생기, 또한 뿌리를 내린 지 400년이 넘은 고목(古木)이 주는 위엄과 푸근한 느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과거 이 곳에 머물렀던 성균관 유생들은 아마 은행나무처럼 건전하게 자라 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따스한 봄날 성균관을 둘러보며 꽃도 보고 옛 글씨들도 둘러보니 과제를 위하여 왔다는 사실은 잊고 성균관의 정취에 빠지게 되었다. 평소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현판 글씨가 이렇게 많은 의미와 정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현판을 외국인 사신이 써주었다는 사실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대성전과 명륜당의 서체는 모두 해서체였지만 전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다. 하나의 필적 안에는 서체와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과 글씨를 쓴 이의 정신도 담겨있다. 우리 역시 글씨를 쓰는 사람으로서 언젠간 필적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을 담은 뒤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른다. 때문에 그 어떤 필적을 남기더라도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정성과 혼을 쏟아 먼 훗날 세상에 아름다운 묵향으로 기억되는 글씨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한다.

좌) 이다혜 학생 / 우) 송유나 학생
글씨21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