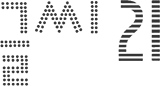|
지난 1월에 실린 김찬호 교수의 전시 평론에 이어 이번 전시에 참여한 김백녕 작가의 반론을 싣습니다. 전시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생산되었으면 합니다. 오감(五感)인가 정감(情感)인가 : 다시 서예비평으로 김백녕(작가) 추위가 한층 심해졌다. 작품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졌다. 모든 것이 전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하다. 지난 12월 초 이화백주년기념관 전시장은 전각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곳은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무늬들과 관람객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충만해있었다. 작가들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고, 관람객들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작품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서로 정감을 나누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전시’란 이처럼 작가의 정과 관람객의 정이 교감·소통하는 그런 생생한 현실을 조성하는 일이다. ‘감상’이란 작가의 정감이 표현된 무늬를 보고, 그 무늬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무늬의 가치를 음미하는 일이다. “작품의 인식적·정감적, 그리고 도덕적 차원 모두가 예술적으로 관련된 요소일 수 있다.1)” 그래서 ‘비평’은 오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은 ‘정감적 인식’이다.
1)앨런 골드만(Alan Goldman), 김정현, 「예술작품의 평가 문제」, 미학대계간행회, 「미학대계 제2권 미학의 문제와 방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220쪽.
전각예술의 본질은 선과 획을 새겨 작가 자신의 시간 의식과 감정·의지·욕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또 그것은 타자성과 주체성, 자연과 인간, 이치와 욕망의 균형·조화를 찰나에 실현하는 활동이다. 오랜 시간 동안의 도법 연마와 장법 구상, 그리고 칼과 돌의 특성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로써 작가의 정신과 사고, 이념과 의지는 선과 획으로 선명해질 수 있다. 여백은 그 선과 획을 떠받들고 있는 지반이다. 선과 획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주며 하나의 온전한 무늬로 실재하게 해준다.

최치원의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 두전 (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頭篆)>
작가의 감정과 시간 의식,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감각은 고전의 전형성을 얼마나 충실히 포착해내고 있는가? 이와 동시에 작가의 주체성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선과 여백, 법고와 창신, 전통과 현대, 타자성과 주체성 등은 균형·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날인되어 있는 무늬에는 작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아름다움의 인식과 체득은 ‘정의 교감과 소통’에 달려 있다. 정감은 오감을 넘어 선 감각이다. 감정과 시간 의식,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감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정감은 아름다움의 인식·체득의 관건이 된다. 아름다움은 오감 만족보다는 더 본질적인 차원, 즉 더 심원한 세계 속에서 체득되는 것이다. 이것이 감상과 비평의 핵심이다.
“아름다움은 깊은 정에 있다. 본체 탐구·체득의 관건은 정이다.”2)
2)이택후, 권호, 「華夏美學」, 서울: 동문선, 1999, 172-189쪽 참고.
『월간 묵가』 1월호 및 글씨21의 「전시논평」에서 김찬호 교수는 한국 전각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줄곧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주목했다. 다양한 매체의 사용, 평면성의 탈피, 다양한 색의 사용 등은 주로 오감 만족과 직결된 것이다. 그는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생각의 전환’이라 여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다. 현상과 본체, 타자성과 주체성을 조화시키려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고착화·탈정형화의 근본적인 방법은 작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철학·사상과 조화시키고, 전각의 전형성에 대한 주체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정감적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정’이란 (겉으로 드러난 사물의) 모습에 상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정신’이 곧 이것이다. 정신의 근원은 사람이지 인장이 아니다. (인장을 새기는) 사람에게 정신이 없으면 (새겨놓은) 인장에도 정신이 담겨 있을 수 없다. “(인장을 새기는) 사람에게 정신이 없다.”라는 말은 기운이 쇠약하고 손놀림이 비실비실하여 (정신이) 인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듯한 정취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비유하면, 졸면서 중얼거리는 것과 같고, 토하면서 마셔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런 모습 속에) 정신의 빛깔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정신이 왕성하면, 열 손가락의 움직임도 날아갈듯 왕성해진다. (이렇게 되면) 한 번 그은 획에는 그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끊어지고 터진 획에는 날아 오를듯한 정신의 빛깔이 담기게 된다. 3)
3)楊士修, 「印母」, “情者, 對貌而言也. 所謂神也, 非印有神, 神在人也. 人無神, 則印亦無神, 所謂人無神者, 其氣奄奄, 其手龍鍾, 無飽滿充足之意. 譬如欲睡而談, 既嘔而飲, 焉有精彩. 若神旺者, 自然十指如翼, 一筆而生息全胎, 斷裂而光芒飛動.”

석개(石開)의 전각 ‘정’은 창작과 감상의 근본이다. 아름다움의 인식·체득은 오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가치의 실현은 역설적이게도 그 오감을 넘어서려는 노력, 오감 너머의 감각을 통해 내면과 내면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다. 거칠게 단순화시켜 말하면, ‘아름다움’은 ‘매력’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끌어당기는 힘인데, 문제는 이 힘이 오감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신은 본뜰 수 없다. 그것은 관람객의 마음과 감정 등에 직접 다가선다. 그리고 쉽게 무시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작과 감상 모두의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성적 사유를 즐겨 한다는 점이다. 오감 자극에만 의존하는 감상·평가는 그래서 언제나 그 특별함을 놓치고 만다. 오감에 전해지는 새롭고 신선한 충격보다는 정감에 의해 인지되는 낡은 것의 힘, 익숙한 것의 가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 인지 방식은 낡은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탈바꿈시켜 주며, 익숙한 것을 지루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보게 만든다. 음미하는 즐거움을 주는 바로 그것,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끄는 바로 그 힘에 주목해야 한다. 그 힘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 힘을 강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작가가 사용한 방법은 적절한가? 이것이 감상의 즐거움이자 비평의 핵심 아닐까?
장법은 형태(를 꾸미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 도법은 정신(을 드러내는 일과 관련된 것)이다. 형태는 본뜰 수 있지만 정신은 본뜰 수 없다.4) 4)徐堅, 「印戔說」, “章法, 形也. 刀法, 神也. 形可摹, 神不可摹.”
전통과 현대, 법고와 창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양자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천 차원에서는 구분될 수 없다. 불교 용어를 써서 말하면, 양자는 둘이 아니다[不二]. 상호 대립적이면서 보완적인 관계다. 전통을 계승하려는 노력 속에도 창작 욕구는 내면화되어 있기 마련이며, 개성 표출에 치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에 대한 답습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다. 벗어나고자 하는 대상 없이는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을 수 없다. 법고의 행위 속에 창신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창신의 과정 자체가 법고의 존재 위에서 성립된다. 이분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사용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또는 너무 손쉽게 처리해버리도록 만든다. 이 이분법에 대한 김찬호 교수의 이해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양자의 관계를 상호작용의 관계로 보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김 아무개의 이 글도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전시에 대한 활발한 담론 생산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붉은 인주를 묻혀 날인하는 순간부터 작품은 대중의 것이 된다. 텍스트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에 의해 창조된다. 바르트(Roland Barthes, 1915~1980)는 이것을 ‘작가의 죽음’이라 표현했다. 추위는 계속될 것이다. 모든 것이 전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르다. 양자를 확연히 구분시켜주는 것은 바로 교감·소통된 ‘정’이다.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감동은 각인되어 사라지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 본 글은 <월간묵가 2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 2. 8 글씨21 편집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