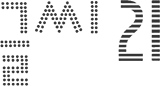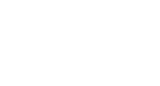서화소식
-
[Interview]
藝結金蘭
예결금란- 韓中代表書藝家 李敦興 劉正成 春樹暮雲展 - 정종원(월간묵가 편집장) 학정 이돈흥(鶴亭 李敦興)과 리우정청(劉正成)의 2인전이 3월 13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동년배인 두 작가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서예가로 20년 간 서예를 통해 교류해왔다. 전시 주제인 ‘예결금란(藝結金蘭)’은 예로써 맺어진 금란지교란 뜻이고 전시명인 ‘춘수모운(春樹暮雲)’ 역시 두보(杜甫)가 멀리 있는 친구인 이백(李白)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지은 시에서 유래한 것이니 이로써 두 작가의 두터운 우정을 짐작할 만하다. 두 작가는 각국의 서예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해 양국 서예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학정 선생은 국제서예가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청소년서예대전을 꾸준히 운영하여 한국 서단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헌하였다. 리우정청 선생은 중국서법가협회의 부비서장으로서 중국 서단의 새로운 부흥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서예잡지 『중국서법(中國書法)』을 창간하였고, 중국 서예사를 총망라한 『중국서법전집(中國書法全集)』 100권 시리즈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매년 당대 최고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명품전의 일환으로, 서예인 및 일반 관객들에게 한·중의 서예술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시 개막식 날인 3월 15일,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학정서예연구원을 찾아 두 작가와 나눈 이야기를 문답 형태로 정리하여 전한다. Q. 이번 전시를 소개해주십시오. (이돈흥(이하 이)) 그간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양국 관계를 풀어보고자 한국과 중국 작가 2인전을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말 경에 결정된 전시라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리우정청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 전시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리우정청(이하 劉)) 한국과 교류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큰 전시는 처음입니다. 한국의 서예가와 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이번 ‘예결금란’이라는 전시명은 이돈흥 선생님과 저, 두 사람만의 우정이 아닌 오래전부터 교류해온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상징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양국의 우정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돈흥 作Q. 두 분의 인연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劉) 여초 김응현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생전에 한국 서단과 중국 서단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김응현 선생님이 권창륜·여원구·이돈흥 선생님 3분과 함께 베이징에 오셨죠. 그때 처음 이돈흥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것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부터입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참가 차 전주에 왔다가 광주에 와 학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주에 올 때마다 광주에 들렀죠. 마찬가지로 학정 선생님도 북경에 오면 꼭 저를 만났습니다. (이) 리우정청 선생님과 10일가량 돈황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가 학문적으로도 높고 서예술에도 깊이 천착한, 훌륭한 작가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친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예술로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지기(知己)라 하겠습니다. Q. 이번 전시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전시의 특징은요? (劉) 지난 10월 말에 결정된 전시라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학정 선생님과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전시였고, 그간 서예로 교류하면서 공부한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마련한 전시입니다.특히 중국의 우수한 시가(詩歌)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을 접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시가 역시 작품에 담았습니다. 또 전·예·해·행·초 등 여러 서체를 선보였는데 초서 작품에는 저의 감정이, 행서에는 저의 사상이 담겨있습니다. 전서와 예서로 쓴 작품은 한·중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청나라 시기, 특히 옹방강과 추사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작가들과 관객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특히 학정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이기에 한국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의 역사를 담고자 했습니다. 김상헌·성삼문의 글이라든지 광주에서 의병장을 했던 충장공 김덕령 장군에 관한 시와 글을 주제로 했습니다.그리고 리우정청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2인전은 상호보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글씨를 보다 보면 ‘아, 무엇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리우정청 선생님께서 겸손하게도 저에게 지도를 해줬으면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야말로 리우정청 선생님께 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한국과 중국 서예가의 2인전으로는 예전에 김응현·치궁(啓功), 권창륜·선펑(沈鵬), 그 뒤로는 박동규·저우샹린(周祥林)의 전시가 있었죠. 저희의 2인전이 4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시가 우리 서단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후배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새로운 목표나 지향점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만큼 좋은 작품을 했나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리우정청 作Q.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劉) 학정 선생님과 저는 서로가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며 영향을 주고받고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흔히 펜으로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서사(書寫)라는 행위로서 교류를 한 셈입니다. 학정 선생님은 높은 경지의 서예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 실력이 잘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 봐도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이의 시나 문장 외에도 선생님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시로 짓고 이를 붓으로 표현하신다면, 서예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서단의 서예가들은 스스로 시를 지어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언어의 문제로 시를 읽을 수는 있어도 짓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작 시를 쓰고 이를 서예작품화한다는 것은 자기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다른 이의 글을 쓸 때도 그 글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특히 행초의 경우,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쓰면 글씨도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리우정청 선생님은 서론에도 밝을 뿐만 아니라 개성이 강한 행초를 씁니다. 행초를 씀에 있어서 장초를 쓴다는 것은 변화를 꾀하는 것을 의미해요. 왕탁 글씨를 보면 이런 장초가 조금씩 섞여있는데 리우정청 선생님의 행초에는 장초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작가들이 넘볼 수 없는, 굉장한 속필이죠. 오래 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글씨입니다. 이돈흥 作Q. 두 분은 국제서예가협회에서 각국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서단이 중국 서단의 발전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요? (이) 그간 한국과 중국의 교류전을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의 실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서예를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지 않고 한문도 가르치지 않다 보니 갈수록 서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서예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서예진흥법 통과 등 정책적으로 서예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몇 사람 개인의 노력으로는 힘들죠. 우리 서예인이 모두 뭉치고 한학자들이 뭉쳐 무엇인가를 해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劉) 한국은 한글을 쓰기 때문에 한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 한자 교육도 하지 않기에 중국의 서예가들보다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많은 서예가들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예를 대하는 정신에 대해 배우곤 합니다. 한국 서단과 중국 서단의 발전은 동보(同步), 같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우정청 作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劉) 두 가지 큰 계획이 있는데 모두 학정 선생님과 관련이 있네요. 우선 이번 2인전을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서예가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중국 작가들에게 보이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가 흘러 80세가 넘었을 때 학정 선생님과 다시 한 번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쓰고 싶습니다. (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리우정청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시를 중국에서 할 수 있다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밥 먹듯이 매일 글씨를 쓰면서 저의 소임을 하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붓하고 노는 것, 그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 본 인터뷰는 『월간 묵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월간 묵가』의 4월 호에서도 인터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4. 4글씨21 편집실
-
[News]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심사결과 발표
2018년도 제 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심사결과가 3월 23일 발표되었다. 지난 3월 19일~20일 작품접수를 마감,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문인화 부문 심사를 치렀으며, 23일에는 특선이상자 휘호가 진행되어 최종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문인화 부문에는 총 2,042점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작품 중 대상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2점, 서울특별시장상 1점, 서울시의회의장상 3점, 특선 146점, 입선 309점 총 474점이 선정되었다.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대상作 이상연 \'그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2018년도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영예의 대상은 ‘그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출품한 이상연씨가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에는 ‘비상2’를 출품한 정재경씨가 ‘탐라의 봄’을 출품한 황옥선씨가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에는 김순곤, 김연순, 김영호, 문옥희, 배순애, 유혜정, 이강옥, 이명애, 이영남, 정석호, 정연한, 한진숙씨가 수상하였다.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최우수상作 정재경 \'비상2\'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최우수상作 황옥선 \'탐라의 봄\'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총 3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여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며 심사는 합의제로 진행되었다. 수상작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장소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다. 1부는 4월 22일(일)부터 4월 25일(수)까지, 2부는 4월 27일(금)부터 4월 30일(월)까지이다. 시상식은 4월 23일(월) 오후3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심사발표는 한국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kfa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8. 4. 4글씨21 편집실 <조직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 명단>조직위원장 : 이범헌조직위원 : 손광식, 탁양지 운영위원장 : 조철수운영위원 : 공명화, 노영애, 이옥자 1차 심사위원장: 이상배1차 심사위원: 강화자, 구석고, 김교심, 김영자, 김진희, 김학길, 박경희, 서금옥, 서복례, 손영호,송윤환, 송형순, 양애선, 윤미형, 이명숙,이상식, 정은숙, 정종숙, 조영희, 채정숙,최영숙, 황경순 2차 심사위원장 : 곽석손 3차 심사위원장: 최창길3차 심사위원: 김옥경, 김외자, 박남정, 윤기종, 이명순, 이영란, 함선호
-
[News]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결과 발표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문인화 부문에 이어 서예부문 심사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었다.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범헌서예부문 총 출품작은 2,132점이며, 출품작 중 수상은 대상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5점, 서울특별시장상 1점, 서울시의회의장상 8점, 특선267점, 입선 388점으로 총 682점이 수상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한글 <서귀포 가는 길 “한라산 중턱에 서서”>를 쓴 김희열씨가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은 <서권문장> 대련을 한문으로 쓴 이재권씨와 <김철영님의 애국가>를 한글로 쓴 정경옥씨가 수상하였다.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作 김희열 \'한라산 중턱에 서서\'우수상은 김도진, 김진수, 문윤성, 박계순, 윤종식, 이지연, 조득임, 최인숙, 홍동기, 오순옥, 정정순, 정화신, 조분례, 서선희, 허유지씨가 수상하였다.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최우수상 作 정경옥 \'김철영님의 애국가\'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에는 특심제도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특심을 1차에 도입하여 총 30%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중 10%는 자동으로 특선이 된다.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최우수상 作 이재권 \'서권문장\'2차에서는 70%를 선정하여 총 100%에 대한 3차 심사가 진행되었다. 1차, 2차, 3차 심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행되며 모든 심사는 합의제로 진행되었다. 수상작 전시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5월1일부터 5월9일까지, 2부는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부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5월 1일(화) 오후3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한국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kf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 4. 4글씨21 편집실 <조직위원>이범헌(위원장), 윤양희, 조왈호, 홍용남 <운영위원>정상옥(위원장), 박춘성, 이무호, 류영희, 조성자, 심현숙, 이일구 <심사위원>1차 [한문] 전명옥[한글] 조종숙 2차강창화(위원장)[한문/소자] 김옥봉(분과 심사위원장), 권기영, 김광한, 김미정, 김선욱, 김수창, 김용남, 김점례, 김정분, 김현중, 문연봉, 박순자, 박양준, 배경희, 신영묵, 연민호, 염동기, 이덕희, 이선경, 이의영, 이재문, 이혜숙, 최기동[한글/소자] 서혜경(분과 심사위원장), 김경숙, 김정숙, 김춘연, 김후분, 박경숙, 박경희, 박화자, 서영현, 이영순, 이정민, 임분순, 정재연, 함민숙[전각] 최석봉[캘리그래피] 박홍주(분과 심사위원장), 박명호 3차지남례(위원장)[한문/소자]박찬경(분과 심사위원장), 김영희, 김재봉, 김향, 박병선, 박순화, 박일구, 방기욱, 송현숙, 이용훈, 임희숙[한글/소자]윤곤순(분과 심사위원장), 구미정, 오병례, 문재평, 이명화, 이지은, 한현숙[전각] 김동배[캘리그래피]박성임
-

[News]
천부인학박물관 개관 및 전각협회 특별전 개최
경북 예천군 초정서예연구원에 천부인학박물관이 개관하였다. 천부인학박물관은 대한민국 국새 제작과정과 인장의 역사를 개괄하여 전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학·전각 전문 박물관이다. 제5대 국새 인뉴 | 제5대 국새 인영인학과 전각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17년 건립 되었으며 지난 4월 7일 개관식과 함께 천부인학박물관 개관을 기념하는 한국전각협회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다. 특별전은 오는 22일까지 개최된다. 천부인학박물관은 실용성의 차원을 넘어 공예, 조형 예술로서 전각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사용자의 정신세계를 표출했던 장르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되새기는 탐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통 예술과 문화에 대한 긍지를 일깨우고자 개관되었다.또 ‘천부(天符)’라는 이름은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신물(神物)인 천부인(天符印) 또는 천부삼인(天符三印)에 관한 구절에서 영감을 받을 것으로 5,000년 전 우리나라 최조의 인장으로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짓게 되었다고 전했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 인장특별전에는 고려시대 ‘청동인’과 조선시대 주요 ‘어보 모형’, 조선 헌종대에 왕실에서 제작됐던 ‘보소당인존’등 약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한국전각협회 회원들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되었다. 개관식 후 진행된 척사대회에서는 천부인학박물관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준비된 척사대회에서 즐거운 열정을 쏟았다. 경합 끝에 효산 손창락씨가 1등을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이날 척사대회의 상품으로 초정 권창륜 선생의 작품을 받는 기쁨을 얻었다.앞으로 천부인학박물관은 인학예술의 체계적인 정립과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체험공간 뿐 아니라 인학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2018. 4. 9글씨21 편집실
-

[News]
문밖세상, 청소년 전통문화탐방 ‘선비트립’ 선보여
어서와~ 선비트립은 처음이지?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인 ‘Art&Culture Story 문밖세상(대표 변희정, 이하 문밖세상)’이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청소년 전통문화탐방 ‘선비트립’>이라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사업을 선보인다. 12~16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전통문화탐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전통문화탐방 ‘선비트립’>은 즐길 거리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선비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지역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이 결합된 \'콘텐츠투어(전통문화탐방)\'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 증가로 인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선비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탐방지 선정은 선비의 상징인 사군자가 유명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선비문화와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적 및 문화재가 있되, 이미 선비의 고장으로 익히 알려진 안동 · 영주 등은 배제되었다. 이는 새로운 선비문화 탐방지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원주 <매화로 만나는 인자함(仁)>, 담양 <대나무로 만나는 지혜(知)>, 화순 <국화로 만나는 의로움(義)> 서천 <난초로 만나는 예절(禮)>‘ 총 4개의 지역을 선정해 지역별로 사군자와 인의예지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주제로 테마를 설정하고 있다. 테마 별로 30명씩 총 4회차를 운영해 연간 120명의 청소년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 방침에 따라 \'소외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우선 선정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필수조건은 아니므로, 만12~16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첫 번째 탐방인 원주지역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금)까지로 문밖세상 홈페이지(www.munbak.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원주지역 탐방은 오는 4월 28일(토)~29일(일)까지 원주 일대에서 1박2일 간 진행되며, 원주향교 · 강원감영 · 한지테마파크 등을 탐방하고 문인화 그리기 · 선비의 삶 역할극 체험 · 과거시험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고 한다. 한편, 문밖세상은 우수한 인력풀과 실행능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탐방지의 시·군·구청 및 지방문화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전문인력(해설사)을 지원받는 등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070-8762-0979)2018. 4. 18글씨21 편집실
-
[News]
서예·장엄경연구가 김정호, <국보123-1호 은제도금금강경 제작기법 분석과 재현> 발표
지난 4월 13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국목간학회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최연식(동국대)의 사회로 인사말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여인욱(동국대학교)의 <로제타석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김정호(서예·장엄경연구가)의 <‘국보 123-1호 은제도금금강경’제작기법 분석과 재현>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정승혜(수원여대)의 사회로 이재환(홍익대학교)의 <新羅의 宦官 官府에 대한 試論>, 조미영(원광대학교)의 <영국사지 석각편들의 고찰>, Ross King(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가 발표 되었다. 김정호 서예·장엄경연구가의 발표한 은제도금금강경 제작기법 분석과 재현의 실험결과는 동판(銅版)에 반서 각자(反書 刻字)한 불경책판(佛經冊版)이 완성되면, 은판으로 양출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완성된다. <은제도금금강경>과 같은 양출(陽出) 기법의 금속경판은 중국과 일본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정양모 관장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양출 문자 표현의 제작 기법에 대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여 오늘날엔 재현할 수 없는 고대(古代)기법으로 여겼고, 그 동안 국보 123-1호의 가치가 빛을 잃고 5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전했다. 김정호 서예·장엄경연구가김정호 장엄경연구가는 “앞으로 한국 유일의 왕궁리 은제도금금강경판 재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그동안 재현과정에서 수많은 고초와 외로움, 작업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표했다.문화재적 가치와 기법의 난이도가 높은 고유기술로 제작된 국모 제123-1호 왕궁리 <은제도금금강경>의 재현은 7세기의 고대기법의 비밀을 처음으로 풀어내었다는 점과 그 기술적 재현을 통하여 문화재 복원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2018. 4. 18글씨21 편집실
-

[News]
제19회 강암서예대전 2차 휘호대회 개최
강암서예학술재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접수기간을 통해 공모한 공모자들 가운데 1차 예심 231명을 선발하였고, 이어 2차 현장휘호대회를 개최하였다. 휘호대회는 4월 21일(토)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제19회 강암서예대전 2차 휘호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문인화 묵죽을 그린 박병하 씨가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양찬호(한문), 송이슬(한문), 윤태휘(한글) 씨가 수상하였다.대상 - 박병하(문인화-묵죽)우수상에는 박영옥(한문), 김수빈(한문), 김찬휘(한글), 이승주(한글), 염정례(문인화), 김은경(문인화)씨가 수상하였다. 이외 특선 30명, 입선 98명이 최종 확정되었다. 창작지원금은 총 1,000만원으로 대상 400만원, 최우수 300만원(각 100만원 씩), 우수상 300만원(각 50만원 씩) 지급되며 특선과 입선에는 상장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송이슬 | 윤태휘 | 양찬호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박병하 씨는 강암서예대전 입선 3회, 서가협회 특선 및 입선 6회, 세계서법 대상 및 초대작가, 해동서예대전 우수상 및 초대작가를 지낸 바 있다. 강암서예학술재단(이사장 송하경)은 “강암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매년 서예문화의 진흥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하여 강암서예대전 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참신하고 실력 있는 서예인을 발굴,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암서예대전은 모범적인 공모전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서예대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4일(목) 오후 3시 강암서예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8. 4. 24글씨21 편집실
-

[News]
서예가 이종선 중국 ‘蘭亭書會서울연구원장’ 취임
제34회 ‘蘭亭書法節’ 기념식 참석 중국절강성 소흥에 소재한 난정서회(회장王建華)는 창립35주년과 34회 난정서법절을 맞아 <蘭亭序印譜>전과 아울러 <해외소장 錢君匋 서화인전>을 4월17일 소흥박물관에서 열었다. 개막식에 앞서 난정서회 서울연구원과 동경연구원에 대한 수패식(授牌式)을 갖고 서울연구원장에 이종선씨를 위촉하면서 난정서회 명예부회장을 보임하였다. 이 날 기념식에는 金一波 소흥시문연주석, 黃偉英 중공소흥시선전부부장, 謝有才 난정서회명예회장, 王建華 난정서회회장 등이 참석하였다.<蘭亭序印譜>전에는 한국에서 구당 여원구, 고산 최은철 두 작가가 출품하였다. 18일에는 제34회 난정서법절 행사와 함께 제6회 <中國書法蘭亭獎> 전시 개막식과 입상수여식이 난정서법박물관에서 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145명의 작가가 중국 전역에서 참여하여 張 繼 등 은상 수상자 5명, 金伯興 등 동상 수상자 6명, 馬永林 등 입선자 46명을 배출하여 시상하고, 高式熊, 張 海 두 작가를 ‘중국文聯 종신성취서법가’로 추대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中國書法蘭亭獎> 전시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극히 소수의 입상자를 배출하여 수상의 권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절강성 출신 작가가 2명뿐인 데에서도 관문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일생을 통해 뛰어난 작품성을 드러낸 원로작가를 가려 종신성취서법가의 명예를 부여하여 참석한 이들을 감동시키며 개막식 대미를 장식하였다. 2018. 4. 25글씨21 편집실
-
[Interview]
토크콘서트, 중국 서예가 리우정청(劉正成)
류정청(劉正成) 선생은 중국 현대 서단이 부흥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천한 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인터뷰는 성공사례를 들어봄으로써 중국서단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서단에도 뭔가 벤치마킹할 만한 요소를 찾고자 해서이다.김희정(이하 김) | 제가 류정청(劉正成) 선생님을 처음 만난 때는 1994년 북경 중앙미술학원에서 석사연구생 때입니다. 중국서법가협회에서 주관하 신화사통신사가 후원한 국제학술토론회가 있다고 하여 방청하러 새벽부터 갔었습니다. 당시 열띤 토론회 장면과 선생님과 나눴던 이야기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리우정청(이하 劉) | 반갑습니다. 24년의 세월이 지났군요. 중국에는 “현대의 사람은 현대의 역사를 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4년이라면 거의 한 세대라고 할 수 있으니, 이제는 그간 중국 서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 먼저, 리우정청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선생님은 중국 현대 서단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분이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986년 중국서법가협회 부비서장으로 부임한 이래 약 20여 년 간 큰 업적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서법가협회의 기관지인 《中国书法》을 발행하여 고대서예와 현대 중국서단에서 모범이 되는 작가와 작품들을 선양함으로써 서예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면서 중국현대서단을 활성화 시킨 점입니다.둘째는, ‘전국중청년서법전각작품전(약칭 中靑展)’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입니다. 직접 심사위원장(평위회주임)도 맡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하여 공모전의 모범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중청전(약칭)’ 중국서단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25세~55세까지 참가할 수 있는 서예공모전입니다. 특히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셋째는, 전국의 학자와 작가들을 결집하여 《中國書法全集》 총100권 씨리즈를 편찬한 일입니다. 각 권마다 이론가와 작가들이 맡아서 정리하였는데, 중국 서법사에 등장하는 작품들과 작가들을 정밀하게 고증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매우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이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가들에게는 작품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 먼저, 《中国书法》은 劉正成 선생님께서 사장이자 주편으로 계시면서 매월 발행한 중국서법가협회 기관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대 서가와 작품도 소개가 되지만, 주로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평론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劉 | 18년 동안 《中国书法》 주필을 맡아 발행했습니다. 처음 중국서법가협회에 부임했을 당시 치공(啓功) 선생님이 주필을 맡고 계셨습니다. 4년 동안 3기를 발행했었고, 제가 제4기부터 맡아 발행하였습니다. 치공선생님께서 주편을 맡고 계셨지만 실제적인 일은 다른 두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내용은 당대 서예가들은 소개하지 않았고, 대부분 옛날 명가들만을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중청년 서예가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잡지나 문학잡지 등은 대부분 당대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는데, 유독 서예잡지에서는 현존하는 작가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으면서는 서예고전과 원로작가보다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청년 작가들에 각별히 관심을 갖었습니다. 당대 잡지는 무엇보다도 당대 작가들과 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잡지가 이러한 기획의도의 전환은 중국서법계에 커다란 전환을 하였습니다. 본 잡지는 서예계 뿐만 아니라 미술계, 문학계, 철학계, 미학계, 고문자학계 등등 서예와 관련이 있는 여타의 학술과 예술분야를 망라하여 원고를 실었습니다. 마흔총이라는 미학자께서는 서예가 왜 예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미학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중국서단에 서예에 대한 관념(인식)을 전환하고 인식을 명확히 하게했습니다. 야오종이(饒宗頤) 선생은 대학자입니다. 제가 직접 방문하여 서예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또 현재 중국서법가협회 부주적으로 계신 당시 중국미술학원 교수 천젼리엔(陳振濂) 선생이 주도하는 ‘학원파’ 서예에 대해서도 잡지에 실었습니다. 당시 ‘학원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에 관한 문장과 작품도 소개하여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실은 이유입니다. 제가 주관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특히 현대서예와 관견 된 문장이나 작가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 다음은 중국서법가협회와 《中国书法》잡지사가 주관한 ‘전국중청년서법전각전(약칭 中靑展)’의 기획 배경과 방법, 그리고 현대 중국 서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요? 劉 | 내가 중국서법가협회에 부임한 다음 해에 ‘중청전’을 주관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작가가 두각을 나타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로작가로 등단하기까지는 먼저 자기가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 시와 성을 순서대로 거쳐 점점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때쯤이면 이미 늙어버립니다. 게다가 당시의 국전은 아무나 출품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지방에서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친 후에야 출품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격을 얻어 출품하게 되지만, 서단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인해 작품의 수준이나 개성보다는 누구의 서풍을 닮았느냐를 먼저 보고 입선 낙선이 결정됐습니다. 예컨대 구양순·안진경과 같은 고전적 서풍이나 치바이스(齊白石), 치궁(啓功) 등과 같은 유명한 서풍의 글씨라야만 인정받아 입선할 수 있었습니다. 북위서체나 간독 글씨, 갑골문 서체 같은 익숙치 못한 서풍의 작품은 낙선되기 일쑤였죠.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중청전>은 지역의 추천이나 유명인사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직접 출품할 수 있고, 개성이 뚜렷해도 입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벽촌에 사는 이라도 좋은 작품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입선을 하고,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김 | 심사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劉 | 심사위원의 경향이 심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일은 서단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북경에 있는 유명한 서예가들이 심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중청전>의 심사위원 구성은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진의 변화에는 치궁(啓功) 선생의 도움 컸습니다.치궁선생님은 <중청전>을 기획하던 당시 중국 서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모시고자 말씀 드리니까, “청년들의 일은 청년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고문으로 모시고, 당시 대부분의 원로작가들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시 60세가 안되셨던 션펑(沈鵬) 선생을 모셨고,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은 55세 미만이었던 중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제2회에서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는데, 제 나이가 40세였고, 가장 젊은 심사위원이었던 천전리엔 교수는 불과 30세였습니다. 또한 북경에 있는 작가에 국한 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작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지역과 유파 나이를 초월하여 오직 실력에 따라 심사 위원장-부위원장-심사위원을 맡겼습니다. 김 |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劉 | 제5회에서 이른바 ‘광시(廣西) 현상’이라 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투표를 통해서 수상작을 뽑고 보니 1등상 수상자 10명 중 4명이 광시성(廣西省) 출신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시성은 중국 외곽 지역으로 서예가 번창한 곳도 아니었고, 그 지역 출신이 심사위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수상자들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위진잔지(魏晉殘紙)의 서체와 서풍을 참고해서 작품을 했는데, 여태껏 공모전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함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들에게 표를 던진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1986년 <제2회 중청전>에 현대파 서예를 등단시켰던 일입니다. 본인은 전통서예 뿐만 아니라 현대파 서예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현대파서예는 서예라고 취급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청전>에서도 현대파 서예가 입선에 들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파 서예학회에 10명의 현대파 서예 작품을 뽑아 추천해주면 입선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사에 에서는 심사장에서 저를 안아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자기들끼리 심사를 다시 하여 모두 낙선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심사결과를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하여 입선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서풍이 등장하고 획기적인 작품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 세 번째로 『중국서법전집』 총 100권 시리즈를 펴내셨는데요, 그 배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劉 | 서예나 미술은 실기와 이론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기를 하지 않은 채 이론에만 치중하다 보면 학술적 깊이가 본질에 닿지 못하기도 합니다. 순수 서론만 하는 학자들은 서예작가를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중국서법전집』의 저자들은 중국 전역에서 이론을 겸비한 우수한 서예가들을 주로 발탁했습니다. 서예가인 동시에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들어 진한대(秦漢代) 저자 중 한 분인 왕용(王鏞) 선생은 오랫동안 진한대의 서예에 천착해왔고, 서예술 역시 진한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높은 안목으로 예술성 있는 작품을 선별할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하여 중국 서단에 학술적 분위기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김 | 중국 현대 서단에는 고전주의·신고전주의·서법주의·학원파서법·민간서법 등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劉 | 송대의 법첩인 『순화각첩』 에 수록된 진(晉) 시대의 글씨는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중국서예사에서 지금처럼 수많은 유파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성장해온 중국서예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파가 좋다 나쁘다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죠. 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나라도 자주 찾아주셔서 서예 발전에 공헌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0정리 김희정
-

[News]
서울 종로구에서 조선 시대 왕비가 사용했던 인장2과 발굴
(재)수도문물연구원(원장 오경택)은 올해 1월 16일부터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서울 종로구 통의동 70번지 유적’에서 조선시대 왕바의 인장인 내교인(內敎印) 2과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내교인 2과현재까지 알려진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중인 2과가 전부로, 발굴조사 중에 내교인이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출토된 ‘내교인’은 2단으로 구성된 정사각형의 인신(印身) 위에 뒷다리는 구부리고 앞다리는 곧게 펴 정면을 보고 있는 동물(추정 ‘충견(忠犬)’)형상의 인뉴(印紐, 손잡이)가 있으며, 위로 솟은 꼬리와 목까지 늘어진 귀에는 세밀한 선으로 세부묘사가 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內敎 印章\'이 내교인보다 다소 크기가 작은 ‘소내교인’도 같은 형상인데, 동물의 고개는 정면이 아닌 약간 위를 향한 모습이다. ‘내교인’의 인장은 너비 4cm×4cm, 높이 5.5cm이며, ‘소내교인’은 인장너비 2cm×2cm에 높이 2.9cm이다. 인장들의 인면(印面)에는 각각 ‘내교(內敎)’라는 글자가 전서체로 새겨져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영조 14년(1761년)의 기록을 통해 ‘내교인(內敎印)’은 조선 시대 왕비가 사용한 도장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 중인 『명례궁봉하책(明禮宮捧下冊)』과 『명례궁상하책(明禮宮上下冊)』에는 왕실재산을 관리했던 명례궁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종류, 지출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발굴현장 전경이러한 기록이 적힌 본문에 먹으로 찍힌 ‘내교인’이라는 글자가 있어, 이를 통해 명례궁의 지출에 대한 검수가 왕비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영조실록(英祖實錄)』 98권, 영조14년(1761) 10월 22일조: (전략) \"자전(慈殿)에는 자교(慈敎)가 있고 내전(內殿)에는 내교(內敎)라 일컬으며, 빈궁(嬪宮)에는 내령(內令)이라 일컫는다. 이에 만약 도서(圖署)하게 되면 세손빈에도 마땅히 그 표시가 있어야 하니, ‘내음(內音)’이라고 하여 체제를 백자(白字)와 같이 하고 궤짝과 흑통(黑筒)을 갖추되 정원에서 만들어 들이게 하라. (후략) 조선과 대한제국의 국새를 포함한 왕실 인사의 보인(寶印)과 부신(符信)을 정리해 고종연간(高宗年間)인 1902년(광무 6년) 무렵 간행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내교인’과 ‘소내교인’ 2과에 대한 도설(圖說), 크기와 재료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통의동에서 출토된 내교인 2과와 그 조형적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출토된 내교인 2과 인면(印面)이번에 내교인2과가 발굴된 지역은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迎秋門) 서쪽으로, 주변에는 조선 시대 관청인 사재감(司宰監) 터와 21대 왕 영조의 사가였던 창의궁(彰義宮) 터가 인접해있다. 조사 결과, 조선 시대부터 근대기에 걸친 건물지 관련 유구 20여 개소와 도자기 조각, 기와 조각 등의 유물들도 확인되었다. 통의동 70번지 유적 출토 \'내교 인장\' 출토 모습출토된 내교인장은 앞으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여 보존처리와 분석과정을 거쳐 유물의 성분과 주조기법 등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선 시대 후기부터 대한제국기의 왕실(황실)에서 사용된 인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2018. 5. 2 글씨21 편집실자료제공 문화재청